서울시립교향악단 - 얍 판 츠베덴과 아우구스틴 하델리히
- 한국클래식음악평론가협회

- 7월 4일
- 3분 분량

음악을 거슬러 흐른 시간의 서사
- 2025 서울시향, 얍 판 츠베덴과 아우구스틴 하델리히 공연 비평
2025년 06월 20일 (금)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시립교향악단, 지휘 얍 판 츠베덴, 바이올린 아우구스틴 하델리히
2025년 6월 20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정기 공연은 단순한 연주회를 넘어, 시간과 정서, 역사적 맥락을 오가는 깊이 있는 예술적 여정을 제시한 무대였다. 지휘는 네덜란드 출신의 명장 얍 판 츠베덴(Jaap van Zweden)이 맡았으며, 바이올린 협연에는 현 시대의 최고 연주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아우구스틴 하델리히(Augustin Hadelich)가 함께했다. 서울시향은 얍 판 츠베덴의 지휘 아래 그동안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섬세하고 진중하게 풀어내며, 세계무대에 도전하는 대표 오케스트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이날 공연은 박영희의 신작에서 출발해 브리튼, 브람스로 이어지는 순서로 구성되었는데, 현대에서 고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의 역류를 음악으로 그려낸 구성이 돋보였다.

Ⅰ. “여인아, 왜 우느냐?” – 박영희, 여인아 왜 우느냐?
공연의 문을 연 곡은 박영희의 2023년 신작, 「여인아 왜 우느냐?」였다. 이 작품은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 사이의 대화를 모티브로, 여성의 시선에서 바라본 구원자에 대한 사랑과 상실, 그리고 부활의 신비를 깊이 있게 탐색한 곡이다. 곡은 첼로의 저음과 타악기의 불규칙한 울림으로 시작하여, 점차 고조되는 현악군의 밀도 높은 진행과 목관의 떨리는 선율, 그리고 전체 오케스트라가 격정적으로 응축되는 클라이맥스를 통해 마리아의 복합적인 감정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날의 연주는 곡이 품은 내면의 감정 곡선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빠른 템포와 선 굵은 아티큘레이션이 전체적으로 긴장감은 높였으나, 감정의 흐름을 음미하고 고통과 구원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음악적으로 구현하는 데에는 다소 급하게 흘러간 인상이었다. 특히 타악기와의 앙상블이 밀도 있게 맞물리지 못한 점, 그리고 현악과 관악 간의 정서적 일체감이 다소 부족했던 점이 곡 전체의 내러티브를 약화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음악의 성과를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렸다는 점에서 이 곡의 연주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Ⅱ. “비장한 내면의 전쟁” – 브리튼,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Op. 15
이어진 곡은 벤저민 브리튼의 바이올린 협주곡. 전쟁의 폐허와 인간 내면의 상처를 고백하듯 풀어낸 이 작품은 20세기 협주곡에서 가장 강렬한 정서적 울림을 지닌 작품 중 하나다.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는 이 곡을 자신의 레퍼토리 중 하나로 오랜 시간 연마해 온 연주자로, 이날 무대에서 그만의 섬세하고 진지한 해석을 펼쳐냈다.
1악장은 팀파니의 여운 속에서 바이올린의 독백처럼 시작되며, 이어지는 플루트와 클라리넷과의 대화적 구조로 긴장과 불안을 표현한다. 하델리히는 바이올린의 섬세한 비브라토와 빠르게 교차하는 포지션 이동을 통해 전장의 공포와 인간 내면의 고독을 절제된 감성으로 구현했다. 특히 2악장의 고조되는 선율선에서 고음역으로의 빠른 도약과 활강은 긴장감의 절정을 이끌어냈고, 카덴차에서의 피치카토와 아르코(활 연주)의 교차는 그의 뛰어난 기술력과 음악적 해석력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곡의 핵심은 오케스트라와의 정서적 응집인데, 이날의 연주는 하델리히의 날카롭고 극적인 표현과 오케스트라의 진중하고 견고한 흐름 사이에 다소 균열이 느껴졌다. 특히 주제부의 교환이 활발한 1악장과 3악장에서 두 축의 감정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아, 오히려 각각의 개성이 따로 부각되는 모습이었으며, 이는 협주곡 특유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남았다. 게다가 하델리히의 고음역 연주에서 몇 차례 음정이 흔들리는 장면은 긴장감이 높은 구조 속에서 연주의 불안정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주는 전체적으로 작곡가의 전쟁 비극에 대한 내면적 고찰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Ⅲ. “고전의 정점에서” – 브람스, 교향곡 제4번 e단조 Op. 98
공연의 마지막은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 4번이었다. 이 곡은 브람스가 고전적 형식미의 정수를 탐구한 작품으로 평가되며, 푸가적 요소와 변주 형식을 기반으로 한 깊은 사유의 음악이다. 얍 판 츠베덴과 서울시향은 이 대곡에서 전체적인 구조의 안정감과 각 악장 간의 정서적 연결성을 바탕으로 고전미를 지향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두 주제가 교차하며 비장하고 응축된 흐름을 형성한다. 츠베덴은 첫 주제를 절제된 강도로 이끌며, 곡 전반의 서사를 조율하는 명민한 해석을 보여주었다. 2악장은 호른과 플루트가 중심이 되는 서정적인 악장으로, 서울시향의 관악 파트의 진화가 특히 인상 깊었다. 호른의 안정된 톤과 오보에의 섬세한 운율은 이 악장의 중심 정서를 잘 표현했다. 3악장의 강렬한 리듬은 현악기의 집중된 에너지로 펼쳐졌으나, 스타카토나 보잉에서의 통일성이 다소 흐트러지면서 거친 질감으로 전개된 점은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마지막 4악장은 변주곡 형식으로, 주제를 잃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색채로 전개되는 구성이 백미였다. 특히 금관과 목관의 조화가 뛰어났는데, 트럼펫과 트럼본, 호른 등 금관군이 선명하면서도 과하지 않게 주제를 받쳐주었고, 플루트와 오보에는 협연자처럼 섬세한 흐름을 형성하며 고전의 미학을 완성시켰다. 서울시향의 관악 파트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안정적이고 정교한 소리를 들려주었으며, 이는 한국 교향악단의 질적 성장의 단면이기도 했다.
음악 속에서 거슬러 흐른 시간의 회고
이번 공연은 단순히 세 곡을 나열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따라가는 음악적 서사로 구성되었다. 현대 한국 작곡가의 신작을 시작으로 20세기 중반의 전쟁 속 고뇌, 그리고 고전의 절정으로 마무리되는 구조는 공연 그 자체가 하나의 서사적 드라마이자 고백처럼 느껴졌다. 박영희의 작품은 해석적 다양성이 요구되는 과정에 있었고, 브리튼의 협주곡은 협연자의 해석이 돋보였으나 오케스트라와의 호흡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브람스 교향곡에서는 오케스트라와 지휘자의 호흡, 관악과 현악의 조화, 악장 간 정서의 연결이 훌륭하게 구현되며 공연의 절정을 완성했다.
서울시향과 얍 판 츠베덴, 그리고 아우구스틴 하델리히가 함께한 이날의 무대는 연주력과 기획력, 예술적 방향성 모두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으며, 클래식의 깊이와 미래의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한 귀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곡들에 대한 시도와 협연자들과의 연주를 통해 지휘자이자 예술감독인 얍 판 프베덴이 목표로 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향한 여정이 순탄하게 이뤄지길 기원해본다.
글 조영환(클래식음악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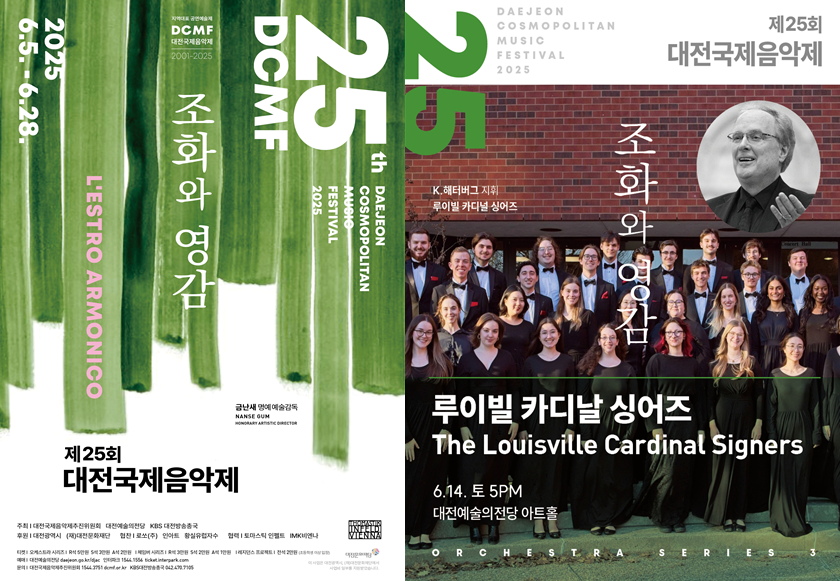
댓글